화약(火藥)’이라는 용어에는 ‘약(藥)’이 있다. 한마디로 맨 처음에는 ‘약’으로 쓰였다는 얘기가 된다.
그랬다. 화약은 염초(초석 혹은 질산칼륨(KNO3))와 숯, 유황을 혼합해서 만든다.
도교사상이 유행한 중국 한나라와 위진남북조 시대에 연단술(煉丹術)의 하나로 사용되었다.
연단술이란 금단(광물로 만든 약)을 조제·복용하는 신선 도술이다.
불로불사를 원한 도사들이 사용한 팔석(八石: 염초, 주사, 웅황, 운모, 공청, 유황, 융염, 자황) 중에는
화약의 재료인 염초(초석)와 유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다. 화약은 염초(초석 혹은 질산칼륨(KNO3))와 숯, 유황을 혼합해서 만든다.
도교사상이 유행한 중국 한나라와 위진남북조 시대에 연단술(煉丹術)의 하나로 사용되었다.
연단술이란 금단(광물로 만든 약)을 조제·복용하는 신선 도술이다.
불로불사를 원한 도사들이 사용한 팔석(八石: 염초, 주사, 웅황, 운모, 공청, 유황, 융염, 자황) 중에는
화약의 재료인 염초(초석)와 유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화약은 약으로 쓰였다
의문이 든다. 초석과 유황 같은 화약 재료가 왜 도교에서 신성시되었을까. 이유가 있다. 단약을 만들려면 재료들을 청동 솥에 넣고 끓여야 한다. 그 재료가 화약 재료(염초, 유황)라서 산화재인 염초와 연소 온도를 낮추는 유황의 화학작용으로 자연스레 불꽃이 튄다. 아마 도교의 도사들은 자연에서 얻는 물질에서 불꽃이 튀는 모습을 보며 신비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 때문에 화약은 무기로 개발된 이후에도 약재로 사용되었다. 명나라 의서인 <본초강목>은 “화약을 장티푸스 등 열병 치료제로 쓴다”라고 했다. 허준(1539~1615)의 <동의보감>도 “염초 성분을 포함한 ‘아궁이 속 흙’과 ‘지붕 아래 먼지’ 등이 약재로 쓰인다”라고 기록했다. 이렇게 약으로 쓰인 화약은 9~10세기 무렵 중국 송나라 때부터 무기로 활용되었다.
그런 화약이 언제 한반도에 도입되었을까. ‘삼별초 항쟁 당시 원나라 장수 흔도가 진도를 공략할 때 쓴 화창과 화포’(<원고려기사> 1271년 5월)가 사료에 남은 첫 기록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손으로 제작·활용된 화기와 화약이 아니었다. 고려는 이후 왜구의 침입에 시달렸지만, 화기는 물론 화약 제조에 쓰일 염초도 없었고 그것을 제조할 기술조차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막 개국한 명나라에 화기 및 화약 제공을 끈질기게 요청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남의 나라에 손을 내밀 것인가.
혜성같이 나타난 최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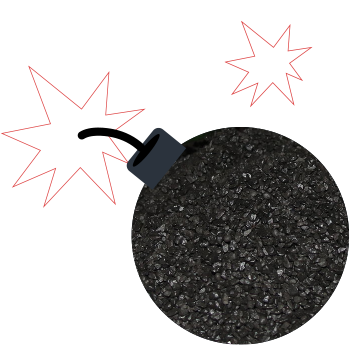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이가 최무선(1325~1395)이다. 최무선의 공은 두 가지였다. “처음으로 화약을 제조하여 능히 왜구를 제어했다”(<태종실록> 1401년 윤 3월 1일)라는 것과, “고려조 말에 화포 제작술을 배워왔다”(<세조실록> 1456년 3월 28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화약 그리고 화약 무기 제조를 한꺼번에 이뤘다는 말이다. 후대의 기록인 <선조실록>은 최무선이 화약 제조법을 습득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다. “고려 때 송나라 상인인 이원이 최무선의 종(노비)의 집에 머물렀다. 이때 최무선이 염초로 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그렇게 배운 무기와 화약 제조법은 책자로 만들어져 아들인 최해산(1380~1443)에게 전해졌다. “최무선의 아들은 최해산이다. 최무선이 임종할 때 책 한 권을 그 부인에게 주고 ‘아이가 장성하면 이 책을 주라’ 했다. 부인은 최해산이 15살이 되었을 때 이 책을 주었다.”(<태조실록> 1396년 4월 19일) 최해산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화기 및 화약 제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최해산이 완구포를 대·중·소 20기를 만들었다. 시험 발사하니 150보나 날아갔다.”(<신증동국여지승람> ‘경도’)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최해산이 처음 왔을 때는 화약이 겨우 6근 4냥이 남아있었는데, 지금(1417년)은 화약이 6,980근 9냥이나 되고 각궁이 1,420장, 중소 화통이 1만 3,500자루, 그 외의 무기도 이 정도”라 소개했다. 덕분에 각종 화기로 무장한 조선군은 세종 연간에 쓰시마를 정벌하고 4군 6진을 개척하고 변방을 안정시켰다.
아궁이 속, 흙과 지붕 아래
먼지에서 찾은 화약

여기서 한 사람의 공을 빼놓을 수 없다. 그가 바로 중인 신분인 역관 김지남(1654~?)이다. 제아무리 최첨단 화약 무기를 제작한다 해도 화약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화약 제조를 위해서는 염초(초석 혹은 질산칼륨(KNO3))와 숯, 유황 등 3가지 재료가 필요했다. 그중 숯(목탄)은 자체 수급이 가능했고, 유황은 화산섬인 일본에서 수입하면 됐다. 하지만 화약 제조의 70 % 이상을 차지하는 염초는 구하기 어려웠다. 당대 인도나 남미 같은 곳에서는 새나 박쥐 등의 분뇨가 광산처럼 널려있어서 구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유럽에서도 인분을 쌓아둔 염초밭을 조성해서 질산염을 대량 생산했다.
그러나 조선에는 분뇨광산도, 염초밭도 없었다.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허준이 이미 ‘아궁이 속 흙과 지붕 아래 먼지’ 등을 장티푸스의 치료약으로 언급하지 않았던가. 그랬다. 약이든 화약이든 만들려면 화장실이나 동굴, 마루 밑, 아궁이, 처마 밑 속 흙 등에서 염초 성분을 찾아야 했다. 그랬기에 ‘취토장(取土匠)’이라는 기술자를 두어 각 집안 곳곳의 먼지와 흙 등을 긁어모았다. 이런 곳의 흙에는 쥐, 개, 닭과 같은 동물의 분뇨와 재, 석회 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모으는 염초는 필요량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역관 김지남이다. 김지남이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자초신방>이라는 책이 고민을 단번에 해결했다.
사실 화약 제조법은 국가기밀이었다. 청나라 조정이 그 비법이 담긴 책을 순순히 내줄리 만무했다. 통역관을 맡아 중국을 방문한 김지남은 ‘염초 구하는 비법’이 적힌 이 책을 입수해서 천신만고 끝에 국경을 넘어왔다. 조선의 무기·화약사 속에서 역관 김지남은 고려 말에 목화씨를 들여온 문익점(1329~1398)을 연상시킨다.


거리의 똥 흙이 화약 재료가 되다
김지남은 이렇게 들여온 <자초신방>을 토대로 <신전자초방>이라는 28쪽짜리 책을 펴냈다. (1698년·숙종 24) 이 책에 적힌 ‘염초 구하는 비법’은 기가 막힌다. 바로 길가에 널려있는 것들에서 염초의 원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똥 흙’이었다. 뭔가 허무개그 같지 않은가. 그러나 길가의 똥 흙을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었다. 왜냐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18~19세기까지는 길가에 똥과 오줌을 마구 버렸기 때문이다. 서양의 하이힐이 중세 유럽에서 똥 천지인 거리를 오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만든 굽 높은 구두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너무도 유명한 일화다.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북학파 실학자인 박제가(1750~1805)는 “서울에서는 냇다리의 석축가에 똥이 더덕더덕 말라붙어 있다”(<북학의>)라고 ‘디스’했다. 김지남 덕분에 똥 천지였던 거리의 흙이 염초밭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것이다. 콜럼버스의 달걀이라 할까. 덕분에 이제는 남의 집 화장실이나 마루, 처마 밑에 들어가 흙을 긁어낼 필요가 없어졌다. <정조실록>(1796년 5월 12일) 그리고 정조의 개인 문집인 <홍재전서> 속에서 정조는 “이제 길가의 흙에서 마음껏 염초를 구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숙종 때 인쇄·반포한 <신전자초방>은 영원히 준수하고 따라야 할 금석과 같은 성헌(成憲·헌법) 같은 책”이라고 극찬했다.
이렇게 얻은 ‘똥 흙’에서 어떻게 염초가 만들어질까. 똥 흙을 잿물과 섞어 끓인 뒤 졸여서 생기는 결정을 얻어내는 것이다. 염초(초석)는 질산칼륨(KNO3)이다. 발효된 생물의 분뇨(질산염(NO3))가 염초의 주원료다. 이 분뇨(질산염(NO3))와 칼륨(K)이 다수 함유된 재나 석회가 잘 섞이고 발효되어야 염초(KNO3)가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똥’이 ‘염초’로, 아니 ‘똥’이 화약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뿌리 깊은 ‘문과 우대’의 결과
조선의 화약과 화약 무기는 이렇게 최무선-최해산 부자와 역관인 김지남 같은 이들 덕분에 발전했다. 그러나 과학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조차 문신들에 비해서는 각박한 평가를 받아왔다. 비근한 예로 당대 최첨단 무기였던 비격진천뢰를 개발한 이장손은 어떻게 대접받았던가. <선조수정실록> 1592년(선조 25) 9월 1일에 경주성 전투를 설명하는 말미에 그것도 실록을 쓴 사관의 부연 설명에 ‘()’형식으로 이장손의 존재를 살짝 덧붙였다.
“비격진천뢰는 그 제도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화포장 이장손이 처음으로 만들었다. 진천뢰를 발사하면 500~600보 날아가 떨어진다. 잠시 후 폭발하므로 진을 함락시키는 데는 가장 좋은 무기였다” 이 내용뿐이다. 생몰년, 가문, 이력은 모두 ‘?’로 남았다. 염초 제조 서적을 몰래 들여온 역관 김지남도 마찬가지다. 정조의 언급이 없었다면 그냥 묻혔을 것이다. 뿌리 깊은 ‘문과 우대’의 가치관 때문이었다. 최무선, 최해산, 김지남, 이장손…. 그들의 이름 석 자를 다시 불러본다.




